카니발
- 왕7
- 2021년 12월 27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2월 1일
Canival
“에리나씨, 죠나단경에 시신을 찾았습니다.”
“...”
나는 정장을 입고 에스코트하는 대로 천천히 따라갔다. 떨렸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샘은 가득 차 아파져 오기까지 했다. 혼자만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는 생각 안 했다. 바로 옆 스피드웨건이 제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며 눈물을 흘려 보였기 때문이다.
“죠나단경에 장례식을 올리겠습니다.”
그의 눈을 감은 모습에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왜, 정말로 이게 단순한 ‘운명’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던 것인가. 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에 젖은 손을 잡았다. 조금만 차가웠다. 천으로 가려져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여도 그의 손에 끼워진 반지는 그라는 것을 알렸다.
“제발….”
그렇게 그는 웅장하고 성스러운 성당에 안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다녀갔다. 모자를 벗고 작은 묵례와 꽃을 두고 저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떠났다. 이상했다. 이 성당은 내 감정을 점점 더 무뎌지게 만들었다. 우주에 떠 있듯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둥실 떠다니는 것만 같았다. 곁에 스피드웨건은 잠에 들었다. 하루 이틀 밤을 새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나는 그를 편하게 앉히고 성당 밖으로 나왔다.
“후….”
“많이 늦었지.”
?!
“혹시 많이 기다렸어?”
죠나단이었다. 죠나단은 같은 테라스에 서서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당신은….”
팡-. 팡-.
저 멀리서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의 웃음이 더 환하게 보였다. 나도 웃었다. 눈물보다 먼저 나온 것은 웃음이었다. 그는 나를 품에 안았다. 누가 저를 희롱하듯 만들어진 환상이라도 상관없었다. 이런 조롱이라면 참을 수 있었다. 봐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있는 힘껏 안았다.
“에리나, 뼈가 부서지겠어.”
“부서질 뼈라도 있나요?”
나와 그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말을 뱉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 갈 거예요?”
“에리나는 언제나 똑똑하구나.”
“...”
“이 폭죽이 꺼질 때, 저 멀리서 나는 떠나야 해.”
그는 내 눈물 자국을 손으로 쓸어 닦아줬다.
“당신 앞에서는 더 울지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울어도 되는걸. 내가 아프게 했으니까……. 미안해.”
“미안하면 이 예쁜 얼굴에 눈 맞춤 정도는 해달라고.”
나는 죠나단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제 얼굴 시선과 맞췄다. 그는 붉어졌다.
그리고 싱긋 웃어 보였다.
“에리나, 오늘도 예쁘네.”
“이제 늙어서 그렇게 봐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걸요?”
쿡쿡 웃었다.
“그러지 말고 저랑 밖으로 나가요. 화려한 카니발을 보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또 분위기 처지게 하지 말고요.”
“하하. 알았어요. 난 당신이 너무 좋아.”
“오늘 그 말만 100번 넘게 들은 거 같아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의 붉은 얼굴에는 글썽이는 눈물도 볼 수 있었다. 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따듯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손이 따듯했다. 나는 더 웃음이 나왔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귀여운 사람을 보고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왕님이 손을 뻗으며 인사를 하면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인사를 하듯 반응을 했고 우리는 그사이에 섞이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즐거워요?”
“당연하지!.”
다시 한번 폭죽이 크게 터질 때 그 둘은 서로를 다정하게 껴안고 입술을 겹쳤다. 진한 얽힘에 그 둘만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만큼은 말이다. 그리고 그이는 나를 다시 한번 안았다. 카니발에 열기가 식어갈 때 즈음이었을까.
“오늘 나를 보고…. 아니 내가 없었어야 했을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 해서.”
“그러지 않기로….”
“그러니까, 오늘만큼만은 나와 행복을 나누고….”
“...”
“잊어줘, 에리나 네가 더 행복할 수 있게.”
나는 양팔로 그의 등을 쓸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을까?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만큼은 그러기로 했다. 당신이 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내 행복이었기에. 당신이 소중해서, 당신의 말을 오늘만큼은 들어주기로 했다.
음악 소리가 우리들의 심장을 뛰고 그는 내 손을 잡아 사람들이 춤을 추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멋진 춤을 추었다. 어렸을 때부터 엉켜버린 발은 지금에 와서야 제대로 맞출 수 있었다. 몸을 붙이며 느리게 손을 뻗거나, 빙글 돌면서 치마의 프릴들을 춤추게 하거나. 온갖 가지로 우리는 살아있음을 즐겼다. 이제는 끝나간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언덕은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죠나단은 다시 한번 웃으며 나를 안았다. 조금 더 포근하고 따듯했고 음, 마지막 같았다.
그는 내 체향을 맡으며 입을 열었다.
“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대를 위해 당신이 날 기다렸다는 그 말만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어.
이제 그러니, 나를 잊고 살아줘. 그리고 이기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그는 마지막 폭죽과 함께 훑어졌다. 나는 그의 온기를 껴안았다.
“아,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그 순간까지 내 말을 들었었구나. 아, 아….”
털썩 앉았다.
그렇게 헐레벌떡 나를 찾던 스피드웨건씨가 나를 발견하고 일으켜 세웠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멋진 카니발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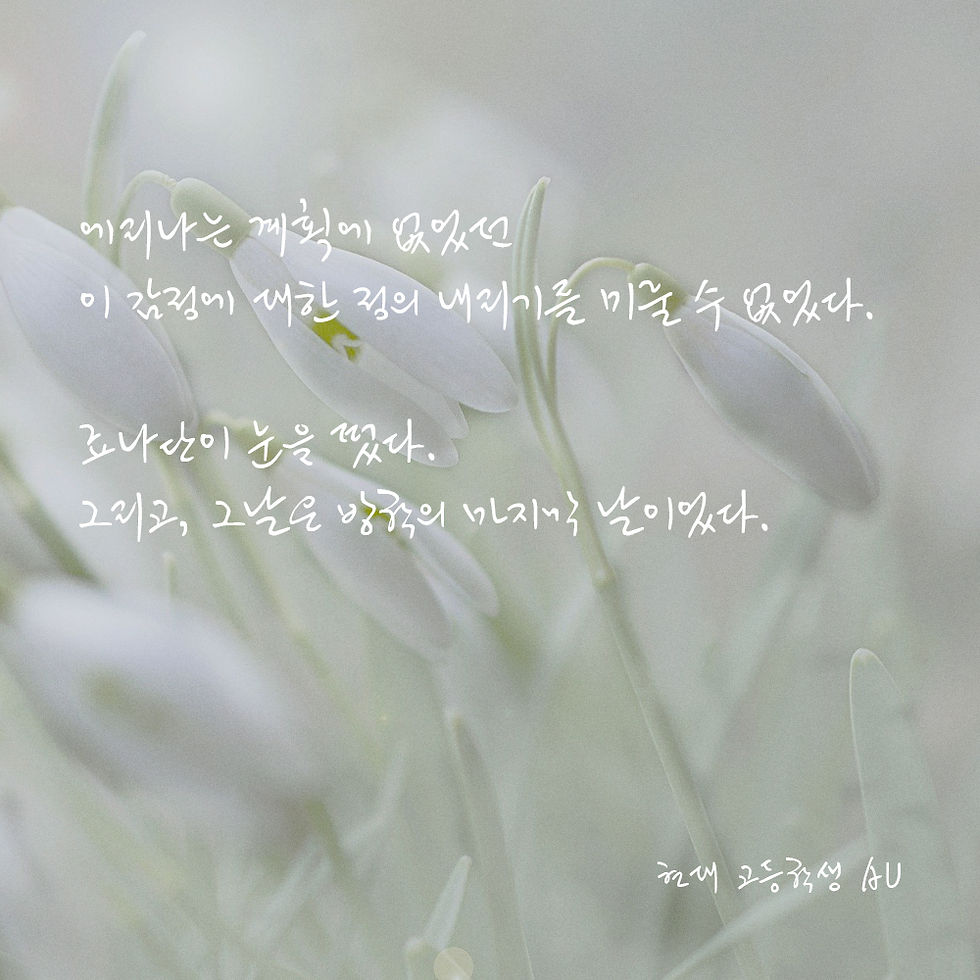


댓글